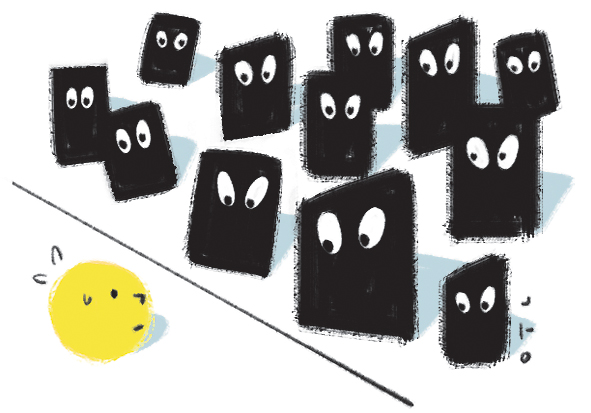왕을 꿈꾸는 자여, 3·1운동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작성일 2022-03-02
2022-03-02

겉모양이 현란할수록 핵심은 단순하다. 코앞 대선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선택지가 의외로 단순하다. ‘왕’이 되려는 자와 ‘일꾼’이 되려는 자의 건곤일척이다. 한 사람은 ‘王’(왕)자를 손바닥에 새기고 매스컴에 나서는 방법으로 온 국민에게 자기 목적을 정직하게 알렸다. 또 한 사람은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서 일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그 목적을 분명히 했다. 21세기에 웬 부적이냐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 간절함을 탓할 순 없다.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간절했으면 신체에 부적까지 새기고 국민 앞에 나섰겠는가. 덕분에 어느 대선보다 선택이 쉬워졌다. 나를 다스려 줄 왕이 필요한 사람은 왕이 되고자 하는 자를 선택하면 되고, 주권자인 나를 위해 일해 줄 일꾼이 필요한 사람은 일꾼이 되고자 하는 자를 선택하면 될 일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탄생 역사와 그 이름의 의미 정도는 되새기고 선택에 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탄생이라는 새로운 역사는 103년 전 오늘 한반도 전역을 뒤흔든 3·1운동이 쏘아 올렸다. 500년을 이어온 ‘왕의 나라’ 조선을 폐기하고 왕의 백성으로 살아온 이 땅의 진짜 주인들을 시민국가의 주권자로 새롭게 등극시킨 것이 다름 아닌 3·1운동이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 이는 한반도에서 제대로 성공시킨 첫 혁명이었다. 그 주역은 식민지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도 봄이 오길 기다리며 조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시민들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세운 나라다. 여러 버전으로 남겨진 독립선언문이 ‘빼박’ 증거다. 상하이 만주 도쿄 서울 등 각기 다른 공간에서 각기 다른 시간에 발표되었는데 놀랍게도 한 방향을 가리켰다. 글은 달랐으되 뜻은 하나였다. “독립 대한은 왕의 나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며 우리는 주권자로서 당당히 이 나라를 지켜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뜻도 이름 그대로다. ‘대한’은 ‘왕의 나라’가 아닌 ‘민의 나라’라는 뜻이다. 주권자가 누구인지 국가 이름에 또박또박 새겨 넣은 나라는 흔치 않다. 왕의 말이 곧 법이 되는 나라에서 절대 주권자인 왕이 어이없게 주권을 외세에 침탈당하자 이 땅의 진짜 백성들이 의연히 일어나 스스로 주권자임을 선언하고 이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것이 3·1운동의 ‘불가역적’ 가치다. 상해임시정부의 탄생은 그 첫 열매였고 함께 탄생한 임시 헌장 10조는 대한민국 헌법이 되었다. 이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기독교 선교사들은 ‘맨손 혁명’이라 이름 붙여 해외로 타전했고 그 감동을 평생 잊지 못했다. 엄동설한에 얼음장을 깨고 진흙밭에서 피어오른 연꽃 속의 진주가 그 아름다움에 비할까.
3·1운동이 펼쳐 보인 대한민국 설계도는 준비에만 꼬박 20년이 걸렸다. 1898년 근대 정치의 첫 실험인 의회 설립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가장 유력했던 입헌군주제가 선택지에서 멀어졌다. 시민 사회가 직접 나서서 그 대안 마련을 위해 기나긴 논의를 시작했고, 최종 답을 얻은 것이 대동평화사상에 기초한 민주 공화국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 공화국에 대한 상상은 식민지 하늘을 뼈아프게 거치면서 확신에 이르렀고 선택의 여지 없는 현실 카드로 확장되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3·1운동을 태극기 휘날린 만세운동으로만 단순하게 떠올린다면, 그 역사적 무게와 깊이는 영원히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를 알았다면 21세기에 고장 난 저울추를 들고 방울을 흔들며 왕 꿈을 꾸게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대선은 후보자의 성적표가 아닌 주권자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날인지도 모르겠다.
하희정 (감신대 객원교수)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33720&code=23111413&sid1=mco

하희정 (감신대 객원교수)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