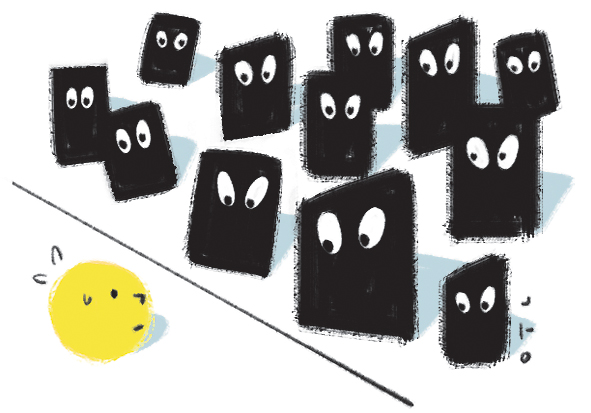[시온의 소리] 가버나움과 SKY캐슬
작성일 2019-02-03
2019-02-03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요.”
영화 ‘가버나움’에서 주인공 소년 자인이 법정에서 부모를 고소하며 한 말이다. 영화는 이 소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펼쳐놓는다. 백향목 숲이 우거진 축복의 땅 레바논은 오랜 내전과 가난으로 폐허가 된 나라다. 주민 4명 중 1명이 난민인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 소년의 시선을 통해 담아낸 이 영화는 관객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든다.
이런 어려움에도 씩씩하게, 때론 기발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주인공이 부모를 고소한다. 그가 “어른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한 것은 난민 신청을 통해 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작은 희망이 무너진 까닭이다. 소년은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었다. 나아가 여동생이 출생증명서가 없어 병원 문턱에서 숨을 거둔 사실을 알게 되자 소년은 분노한다.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과학기술로 자신을 창조한 박사를 죽이며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는 나를 창조했지만 내게 이름을 주지 않았소.” 여기에서 이름이란 무엇인가. 바로 나의 존재 의미를 말한다.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과학적 진보에 박사는 환호했지만 정작 그렇게 탄생한 괴물은 사회로부터 거부당하며 숨어 지내야 했다. 이 소설은 단지 문명을 통한 공상과학소설 같은 상상력을 넘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묵직한 실존주의적 질문을 던진다. 태어남은 축복이라 여겨지지만 ‘가버나움’ 주인공 소년이 처한 절망적 상황에서의 태어남은 오히려 저주로 여겨질 것이다. 주인공인 자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살아내려는 절절한 생의 의지와 자신의 삶을 둘러싼 근원적 부조리 사이에서 절망하고 분노한다.
이는 꼭 물질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SKY캐슬’에서 부모에 의해 강요된 명문대 진학의 압박은 등장인물들의 삶을 절망으로 밀어 넣는다.
“더 이상 아버지와 살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강준상이 없다고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만든 무대 위에 꼭두각시로 살아왔어요. 언제까지 남들 시선에 매달려 껍데기로 살 건가요.” 드라마는 더 높은 곳을 향해 욕망의 탑을 쌓는 인간의 슬픈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성경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라는 선포로 시작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이름을 준 것은 바로 인간이다.(창 2:19)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의 이름을 짓는 ‘의미의 창조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주셨다. 이름은 단지 호칭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의 이름 안에는 그 자체로 삶의 목적과 축복이 담겨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영화 ‘가버나움’과 드라마 ‘SKY캐슬’에 등장하는 부모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과 이런 교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녀는 그저 ‘신이 준 선물’이라고 말하며 출산과 방임을 반복하는 부모들의 품에서, ‘3대째 의사 가문’이란 욕망의 껍데기로 아이들을 몰아넣는 할머니의 품에서 자녀들은 냉소를 보내며 벗어난다.
‘3포세대’ ‘이생망’ ‘헬조선’ ‘소확행’ 같은 신조어를 통해 영화와 드라마에서 접한 유사한 절망과 냉소를 이 시대 청년에게서도 발견하게 된다. 무엇이 우리네 젊은이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 이 혼돈의 시기에 다음세대가 자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어른들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축복의 땅 가버나움은 이제 배덕과 혼돈을 상징하는 이름이 됐다. 우리 시대의 교회 역시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을 욕망의 ‘SKY캐슬’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곳이 다시 말씀과 기적의 빛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영화의 마지막에 소년 자인이 다시 희망을 찾으며 지었던 환한 미소처럼 말이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9759&code=23111413&sid1=mco

윤영훈 (성결대 교수)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