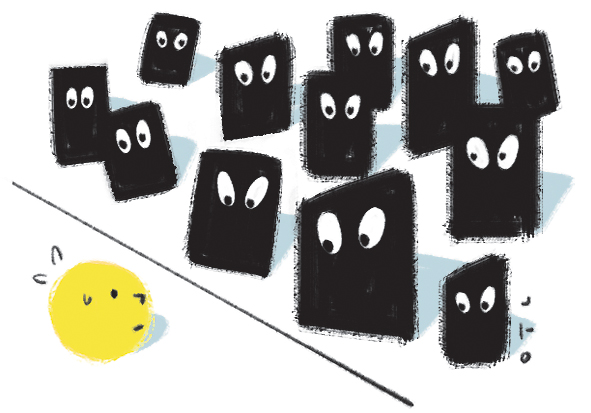예스러운 노래의 재발견
작성일 2020-03-26
2020-03-26

트로트 열풍이 거세다. 일시적 현상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제는 중장년의 향수를 넘어 자신만의 ‘임’과 ‘영웅’에게 열광하며 10대 팬덤을 능가하는 ‘덕질’이 한창이다. 젊은이와 어린이도 트로트 정취를 공유하게 됐다. 최고의 문화 콘텐츠가 된 것이다.
나이가 드니 이전에 무시했던 트로트가 새롭게 들린다. 무엇보다 인생의 보편적 감수성을 담아낸 노랫말에 끌린다. 음악적 평가를 넘어 트로트엔 한국적인 한과 흥의 정서가 가득하다. 트로트 가수는 기본적으로 가창력이 뛰어난데, 이들의 창법은 그 감수성을 배가시킨다. TV조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우승한 임영웅이 다시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는 김광석의 포크 버전 못지않은 감동으로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번 트로트 열풍은 참가자의 사연과 노래가 만나 듣는 이의 마음에 전달되는 공감의 힘에 기인한다.
1980년대 청년 문화를 소비하며 10대를 보낸 나는 트로트가 참 싫었다. 나뿐 아니라 당시 또래들도 소위 ‘뽕’기 가득한 한국가요 대신 미국의 팝송을 즐겼다. 그러다 이문세나 유재하가 등장했다. 이들은 한국가요를 뽕에서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들이 부르는 뽕기 없는 서정성은 당시뿐 아니라 이후 한국 대중음악의 발라드 문법이 돼 젊은이의 사랑을 받았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소위 ‘은혜 찬송’이라 불린 복음성가는 세련된 팝 감각을 지향한 8090 청년세대의 취향에 잘 들어맞지 않았다. 성인가요에 대한 저항이 현대기독교음악(CCM) 운동의 문화적 특성이었는지 모른다. 당시 성인 집회에서 자주 불리던 ‘은혜 찬송’은 트로트의 문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눈물을 짜내는 듯한 신파적 감성은 그리스도 구원의 감격을 꼭 그렇게 표현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게 했다. 80년대 중반에 등장한 주찬양선교단의 노래나 두란노 경배와 찬양 집회의 세련된 찬송에서 이전과 다른 기독 문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지난달 지인 딸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장소나 만찬 등 모든 면에서 격조가 느껴지는 결혼 예식이었다. 신부가 특별한 축가 순서를 마련했다고 해 주목했다. 성악가의 고급스러운 성가나 세련된 젊은 가수의 사랑 노래를 기대했는데, 한 중년 목회자가 트로트 창법으로 ‘사랑의 종소리’를 불렀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고 가는 길.”(김석균, ‘사랑의 종소리’)
식장의 청중들이 이 찬송에 큰 감동을 받았는지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나 역시 이 노래가 전하는 깊이 있는 가사와 꾸밈없이 노래하며 축복하는 목회자의 음성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어릴 때부터 참 자주 들었고, 이제는 젊은이의 축가에 간간이 등장하는 이 옛 노래가 전하는 감동은 은총의 순간이었다. 진정한 ‘축가’였다.
옛 흑인 가스펠을 들어보면 연주와 창법, 가사에서 ‘은혜 찬송’과 놀랍도록 유사한 정서를 느낄 수 있다. 트로트와 가스펠의 절묘한 융합이 한국형 복음성가의 독특한 색깔이다. 그땐 몰랐지만 ‘은혜 찬송’은 어려운 시절을 인내하는 한국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대변했다. 흑인뿐 아니라 우리도 자신의 고난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공감하며 인내해온 것이다. 회심 이전의 절망과 거듭남의 감격이 가수의 개인적 아픔을 극복하는 이야기와 만날 때, 그의 노래는 내 노래가 된다. 시간이 지나고 장르는 변할지라도 우리에겐 늘 개인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좋은 노래가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대중가요니까.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29722&code=23111413&sid1=mco

윤영훈 (성결대 교수)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