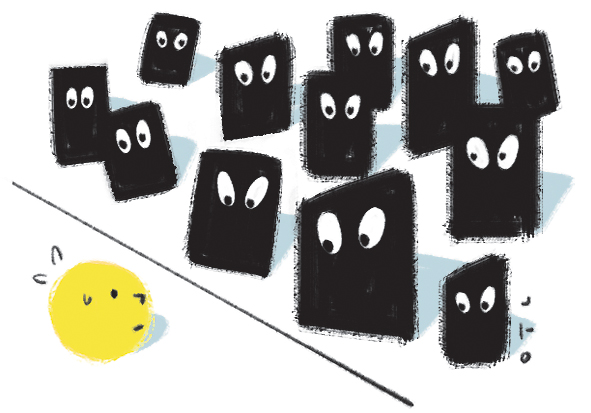할머니의 강
작성일 2018-02-04
2018-02-04

무릎 관절이 아파 한 쪽 다리는 제대로 구부리지도 못하고, 게다가 눈도 어두우면서 힘겹게 다슬기를 잡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순임이는 늘 마음이 아팠다. 이불 속에 누워 한참을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있던 순임이가 갑자기 피식 웃었다. 왜냐하면 지금쯤 마을 앞 샛강에 깔려있는 수많은 다슬기들을 잡으며 한없이 기뻐할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그 많은 다슬기들이 순임이가 잡아다 놓은 다슬기라는 것을 모를 게 분명했다.
이른 새벽, 곤한 잠에서 깬 순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다락문을 열었다. 순임이는 얼굴 전체를 덮고도 남을 만한 까맣고 둥그런 물안경을 집어 들고 앞마당으로 나갔다. 마당에 피어있던 분꽃들이 새벽이슬을 머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순임이는 장독대 옆에 놓여있던 소쿠리 하나를 챙겨들고 마을 앞 샛강으로 향했다. 이웃마을까지 향하는 길이 짙은 물안개로 온통 묻혀버렸고 강가에 우뚝 솟아 있던 벼락바위마저도 그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며칠 전 큰 비가 와서인지 마을 앞 샛강엔 평소보다 많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다행히도 이웃마을 다슬기 방죽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는 흐릿하게나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순임이가 폴짝 건너가는 소리에 놀랐는지 징검돌 위에 앉아 있던 자라 한 마리가 미끄러지듯 물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다슬기 방죽에는 진녹색의 다슬기가 지천으로 깔려있었다. 손을 담그면 금세라도 손끝에 푸른 물이 들 것만 같았다. 빨간 열매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망개나무 한 그루가 물가에 한가로이 휘늘어져 있었다.
순임이는 입고 있던 바지를 한껏 올려붙였다. 순임이는 낡고 커다란 물안경을 쓰고 허벅지까지 차는 물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다리를 휘감고 올라오는 차가움이 등줄기까지 타고 오르는 듯 했다. 물속에 고개를 디밀자 맑고 투명한 물속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낯선 이의 침입에 작은 쏘가리 한 마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잽싸게 바위 밑으로 숨어버렸다. 순임이는 물속에 깔려있던 다슬기들을 하나하나 잡기 시작했다. 다슬기들이 한 주먹 모아졌을 때 ‘푸’ 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순임이는 얼굴을 들어올렸다. 워낙에 다슬기가 많아서인지 소쿠리 하나를 채우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웃마을에서 닭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멀리 보이는 들녘까지 여린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푸른 하늘의 싱그러움이 어느새 물속까지 내려앉아 느릿느릿 흘러가고 있었다. 물속을 몰려다니던 피라미 새끼 한 마리가 순임이 발목을 톡톡 치며 지나갔다. 강 건너 숲 속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 정도면 됐겠지….”
순임이는 기대 이상의 성과에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동네 샛강으로 향했다.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비릿한 물 냄새를 풍기며 짙은 물안개를 걷어가고 있었다. 강물 위에 오도마니 앉아있는 커다란 벼락바위와 그 옆 작은 애기바위의 모습까지 한 눈에 들어왔다. 순임이는 내렸던 바지를 다시 올려붙이고 애기 바위 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날이 밝아서인지 마을 앞 강물은 다슬기 방죽처럼 차갑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음매’ 하는 송아지의 앳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시든 풀잎처럼 날개 색이 누렇게 변한 방아깨비 한 마리가 툇마루 위에 힘없이 앉아있었다. 순임이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순임이는 아직 개어놓지 않은 자신의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갔다. 바로 그때 안방에서 할머니의 쓸쓸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영감, 오늘은 물이 좀 빠졌을 테니 요 앞 물가에 한 번 다녀와야겠어요.”
평생 가난을 등에 지고 살아온 할머니의 쓸쓸한 목소리였다.
“어서 내가 일어나야 할 텐데…. 무릎도 시원치 않은 할멈을 이렇게 고생만 시키고 있으니 걱정이구만.”
할아버지의 서글픈 목소리가 간단없이 쏟아지는 밭은 기침 소리와 함께 순임이 귓가로 나지막이 들려왔다. 잠시 후 안방 문 열리는 소리가 났고 곧이어 할머니가 사립문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순임이는 강 쪽으로 펼쳐져 있는 올망졸망한 논배미들을 가로질러 애기바위 쪽을 향해 걷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힘든 농사일에 짬짬이 다슬기를 잡아 어려운 살림을 보태야만 하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순임이는 할머니가 안쓰러웠다. 할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어린 순임이가 물에 들어가는 일만은 절대로 허락지 않았던 할머니였다. 무릎 관절이 아파 한 쪽 다리는 제대로 구부리지도 못하고, 게다가 눈도 어두우면서 힘겹게 다슬기를 잡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순임이는 늘 마음이 아팠다.
이불 속에 누워 한참을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있던 순임이가 갑자기 피식 웃었다. 왜냐하면 지금쯤 마을 앞 샛강에 깔려있는 수많은 다슬기들을 잡으며 한없이 기뻐할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그 많은 다슬기들이 순임이가 잡아다 놓은 다슬기라는 것을 모를 게 분명했다. 이른 새벽, 이웃마을 다슬기 방죽에서 잡아온 많은 다슬기들을 순임이는 할머니가 늘 가는 동네 애기바위 아래쪽에 몰래 뿌려놓았던 것이다.
“내일도 비가 오지 말아야 할 텐데….”
순임이는 혼잣말을 했다. 순임이는 문득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뭉클한 어떤 것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햇살이 스며드는 창문 밖으로 따뜻한 초록 바람이 지나갔다.†

이철환 (소설가)
작품으로는 430만 명의 독자들이 읽은 <연탄길 1,2,3>과 <행복한 고물상>과 <위로>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등 총 23권이 있다. 작가의 작품 중 총 10편의 글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고, 뮤지컬 연탄길 대본은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2000년부터 책 수익금으로 운영해 온 ‘연탄길 나눔터 기금’을 통해, 낮고 그늘진 곳에 있는 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